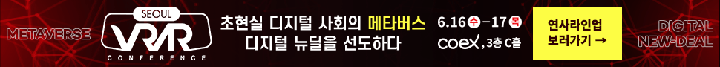막걸리가 와인보다 과학적이다! '조상님들의 비밀 레시피' 최초 공개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발효주, 와인과 막걸리의 제조 과정에는 흥미로운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제조 방식의 차이를 넘어,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동서양을 대표하는 두 발효주, 와인과 막걸리의 제조 과정에는 흥미로운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제조 방식의 차이를 넘어,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와인의 역사는 인류 문명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최초의 와인은 약 8000년 전 조지아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를 거쳐 서유럽으로 전파되며, 특히 기독교 문화권에서 성찬용 포도주로 사용되면서 더욱 발전했다.
와인 제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단순함에 있다. 포도알을 으깨면 자연스럽게 과즙이 나오고, 포도 껍질에 붙어있는 야생 효모가 당분을 분해하며 자연스럽게 발효가 시작된다. 이런 단순한 '단발효' 과정 덕분에 인류는 일찍부터 와인을 즐길 수 있었다.
반면 우리의 막걸리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쌀이라는 원재료부터가 그렇다. 쌀에는 포도와 달리 효모가 바로 먹을 수 있는 당분이 없다. 쌀의 주성분인 전분을 먼저 당분으로 분해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당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효소가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이 문제를 누룩이라는 독특한 발효제로 해결했다. 누룩은 밀이나 보리를 빚어 만든 덩어리로, 그 안에는 효소와 효모가 모두 들어있다. 효소가 먼저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하고, 이어서 효모가 그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병행 복발효' 방식이다. 이는 마치 압축파일을 푸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역설적으로 한국 전통주의 다양성을 가져왔다. 막걸리 원액은 14~15도의 높은 도수를 자랑하는데, 이를 걸러내면 약주가 되고, 맑은 윗부분만 따로 모으면 청주가 된다. 더 나아가 이를 증류하면 소주가 탄생한다. 조선 시대 명주로 꼽히는 감홍로나 홍로주도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효모와 효소의 차이다. 한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 효소(酵素)는 '항아리 속에서 흰 쌀을 삭히는 물질'을, 효모(酵母)는 '삭힌 것을 품고 술을 낳는 어머니'를 의미한다. 이처럼 정교한 발효 과학이 우리 전통주 문화에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현대에는 맥주라는 또 다른 양조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맥주는 보리를 발아시켜 효소를 얻는 '단행 복발효'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막걸리의 병행 복발효만큼 높은 도수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각각의 발효 방식은 그 지역의 문화와 기후, 농작물의 특성을 반영하며 발전해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