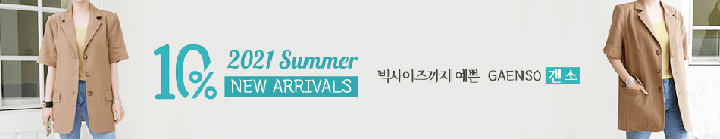남자는 결혼 원하고 여자는 도망가는 시대... '솔로 천국' 대한민국의 비극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653명을 대상으로 결혼 가치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과거 결혼을 인생의 필수 과정으로 여기던 전통적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난 결과로, 현대 직장인들의 달라진 결혼관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653명을 대상으로 결혼 가치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과거 결혼을 인생의 필수 과정으로 여기던 전통적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난 결과로, 현대 직장인들의 달라진 결혼관을 여실히 보여준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직장 규모별로 결혼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직장인의 43.8%가 결혼을 필수로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중견기업은 40.0%, 중소기업은 38.7%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결혼을 필수적인 삶의 과정으로 여기는 경향이 다소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환경과 급여 체계를 갖춘 대기업 직원들이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결혼관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여성 직장인의 경우 무려 75.3%가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4명 중 3명의 여성 직장인이 결혼을 선택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남성 직장인은 50.3%가 '결혼은 필수'라고 답해 여성과 남성 간의 결혼관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별 간 인식 차이는 결혼 제도 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부담, 경력 단절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독립성이 향상되면서 결혼을 통한 안정보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커리어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미혼 직장인들의 결혼 의향을 살펴보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66.6%,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33.4%로 나타났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직장인 중 3명 중 2명은 여전히 결혼에 대한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3명 중 1명은 결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직장인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 안정'으로 57.5%를 차지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결혼이 경제적 안정이나 사회적 의무보다는 정서적 파트너십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2세 출산에 대한 니즈'가 17.6%,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가 8.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세 출산에 대한 니즈가 두 번째로 높은 이유로 꼽힌 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법적 혼인 관계 내에서의 출산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결혼과 출산을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들이 제시한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로 39.7%에 달했다. 이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23.7%로 두 번째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택 가격 상승, 고용 불안정, 양육비 부담 등 경제적 요인이 결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17.6%를 차지했는데, 이는 개인의 취향과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적합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결혼 적령기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결혼하기보다, 자신과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이 맞는 파트너를 찾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 더 이상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가 아닌,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혼인율과 출산율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주택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 대책 등 다양한 사회 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변화하는 결혼관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근무 환경 개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